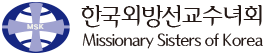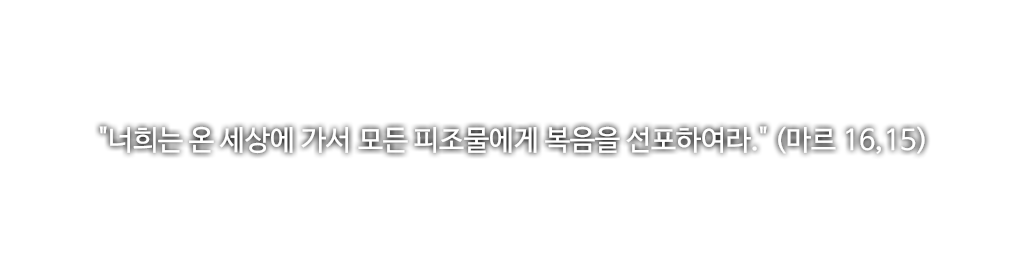“쇼뮤샤 네이” (“괜찮아요, 문제없어요”)
열악한 환경으로 옴에 걸린 아이들… 치료받을 생각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로 여겨지는 것을 “문제없다” 말하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기다리다 보면 이뤄지는 것을 지켜보며
“쇼뮤샤 네이”라는 기막히도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이 나라 국민 행복 지수를 세계 최고로 만든 듯합니다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앗 쌀라 마이쿰)”
방글라데시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외방선교수녀회는 2006년 당시 방글라데시 교황대사이셨던 장인남 대주교님의 초청으로 처음 방글라데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3개의 수녀회가 함께 진출했고,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서로 의지하며 초창기 무슬림 국가에서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2010년 파견을 받고 간호사로서 이곳 진료소에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함께 운영하는 여학생 기숙사에서도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예전에 동파키스탄으로 알려졌던 나라입니다. 언어 문제로 인한 갈등이 대두되어 1971년 3월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선포, 같은 해 12월 16일 독립 전쟁에서 승리해 방글라어를 쓰는 오늘날의 국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진료소에서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모습
가톨릭 신자 인구의 1%도 안 되지만 신앙의 뿌리 깊어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3분의 2 크기이지만, 인구는 1억 7000만 명이나 됩니다. 1인당 GDP는 2140달러. 의류, 가죽, 제지, 황마 등을 수출하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의 3면이 인도에 둘러싸여 있고, 삼각주에 세워진 나라이기에 대체로 땅은 비옥합니다. 2모작 또는 3모작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절상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 이 나라 특성상 우기철(4~10월)이 되면 대부분 땅이 침수 지역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시를 제외한 시골에 터전을 둔 국민들의 삶은 고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기로는 세상 어느 나라와도 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해마다 우기면 홍수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의 피해가 상당하며, 지속적인 어려움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종교는 이슬람교(88%), 힌두교 등 기타(12%)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뿌리는 깊습니다. 총 2개 관구(다카관구-6개 교구, 치타공관구-3개 교구)로, 저희 수녀회가 선교하고 있는 곳은 방글라데시 북서쪽에 위치한 다카관구에 속한 디나즈풀 교구입니다.
저희가 언어연수를 마치고 문화를 배워가면서 만나게 된 PIME(교황청 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150년 전에 선교지에 오심) 이미 들어와 풍토병으로 죽고,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며 신앙의 터전을 잡아 놓은 곳이기에 저희 수녀들이 파견되어 왔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걸어간 선배 선교사들이 있음이 얼마나 커다란 행운인가를 순간순간 느낍니다. 이분들이 일궈놓은 본당과 여러 사도직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한편의 선교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감동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병원에 있는 초 앞에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
선교사 신부 평균 나이 70대 초반 “은퇴란 없다”
지난 10월 7일 토요일엔 저희가 다니는 성당 주임 신부님(이탈리아 PIME 소속)의 사제수품 5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미사가 있었습니다. 사제품을 받고 1년 후 바로 이곳 방글라데시로 파견되어 반평생을 선교에 힘쓰신 분입니다. 그러다 지난 5월 건강이 매우 안 좋아져 본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자, 다시 못 올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예감 탓이었는지 신부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송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부님의 바람과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신부님께서는 3개월 만에 다소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대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선교사 신부님들의 연세는 평균 70대 초반. ‘이미 은퇴하셔야 할 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선교지에서 젊은 날을 바쳐온 이분들에게 은퇴란 없어 보입니다. 병들고 노쇠하여 본국에 가셨다가도 조금이나마 기력을 찾으면 지체없이 이곳 선교지로 돌아와 생의 마지막까지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몫을 찾아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젊은 선교사인 저희에게는 깊은 감동과 존경스러운 모델이 됩니다.

릭샤 타고 이동하는 중
녹슨 양철 지붕 새지 않을까 걱정
방글라데시의 시골 환경은 마치 우리나라의 1960년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저희가 사는 디나즈풀은 방글라데시 북서쪽 인도와 국경이 접한 시골 지역으로, 더욱 확연하게 서민들의 생활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도시를 벗어난 지역 대부분에선 아직도 소똥을 말려 불쏘시개를 만들고, 나무 땔감과 볏짚을 이용해 밥을 짓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밥 짓는 연기가 우리 수녀원 담장 너머로 안개처럼 올라옵니다. 집들은 여전히 양철과 대나무를 이용해 지붕을 얹어 비와 햇볕을 가리고, 수동 펌프로 물을 길어 사용합니다.
우기철이면 녹슨 양철 지붕이 새지 않을까 걱정되어 뜬눈으로 잠을 설치다 출근했다는 직원들의 말에 저 역시 비만 오면 하늘을 보며 푸념 섞인 투정을 하곤 합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9월과 10월에 많은 비가 내렸고, 다들 여기저기서 수녀원에 모아둔 낡은 양철이 없냐고 묻습니다. 여기선 벽돌로 지어진 집에 시멘트 바닥에 사는 것만으로도 넉넉한 축에 속합니다.
몇 년 전 언어 연수를 마치고 병원 실습을 나가면서 저녁엔 마을 공부방을 봐주던 때였습니다. 공부방 바로 앞집의 젊은 어머니가 달려와 큰아들이 갑자기 열이 많이 오르고 통증을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급히 가보니 옴으로 인한 증상이었고, 다른 아이들 역시 옴에 걸려 가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치료받을 생각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개선해야만 완치할 수 있을 텐데, 대나무로 엮어 만든 벽, 양철 지붕, 오래된 시멘트 바닥의 2칸짜리 좁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낮엔 아이들 방이지만, 밤이면 집에서 키우는 염소나 소 등의 가축들을 행여 도둑맞진 않을까 싶어 방 안에 데리고 들어와 함께 사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너무 안쓰러운 생각에 “저 마을의 낡은 집들을 모두 불사르고 새로 지어야 옴을 잡을 수 있겠다”고 했더니 “로마 시대의 네로가 나타났다”며 크게 웃으시던 연로한 선교사 신부님도 이젠 세상을 떠나 곁에 안 계십니다.

방글라데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
그날 하루 먹을 끼니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
시간은 10여 년이 흘러 도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가난한 시골 서민들의 삶은 그다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10년 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행복하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그날 하루 먹을 끼니만 있어도 행복해하는 이들입니다.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쇼뮤샤 네이”(괜찮아요, 문제없어요)입니다.
새로 사는 물건이 너무도 확연히 때가 타고 흠집이 있어도 바꿔주려 하기 보다 “쇼뮤샤 네이” 합니다. 비 오는 날 릭샤(자전거를 고쳐 만든 2인용 교통수단)를 타고 내렸는데, 녹물이 수도복 자락 여기저기 묻어 난처해 하는 제게 하는 말도 “쇼뮤샤 네이”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제때에 오지 않아 낭패스러울 때도 이들은 말합니다. “쇼뮤샤 네이!”
방글라데시의 생활은 그야말로 기다림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빨리빨리’, ‘신속 정확하게’에 익숙해 있던 제겐 몇 시간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 일 아닌 듯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제겐 문제로 여겨지는 것을 “문제없다”고 말하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기다리다 보면 이뤄지는 것을 지켜보며 “쇼뮤샤 네이”라는 기막히도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이 나라 국민 행복 지수를 세계 최고로 만든 듯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닐까도 생각해봅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501-132723
예금주 : (재)천주교한국외방선교수녀회
김진희(콘솔라따) 수녀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방글라데시 공동체 책임자
출처 : https://news.cpbc.co.kr/article/1112926. 가톨릭평화신문. 제 17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