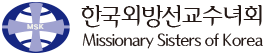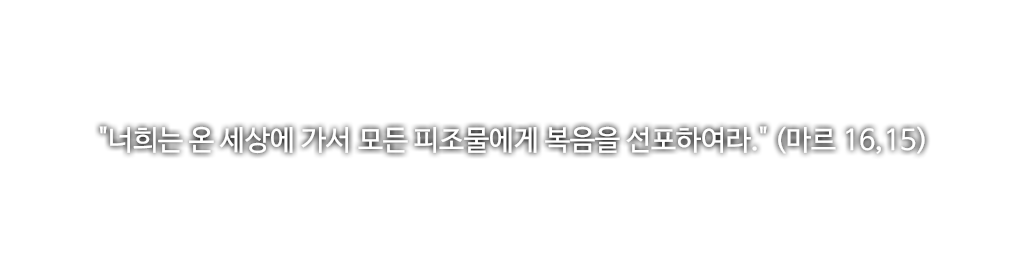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서울대교구 필리핀 유학
2005년도에 올리비아 핫세 주연의 영화 ‘마더 데레사’를 보고 내 안에 성소의 불씨가 더욱 타올랐던 기억이 난다. 극중 초반에 마더 데레사는 주님으로부터 훗날 사랑의 선교회의 창립 모토가 되는 새로운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다. 평범한 수녀였던 그녀가 사람들로 붐비는 기차역 한구석에서 굶어 죽어가 한 걸인의 힘겨운 손짓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가 성녀에게 건넨 이 한마디 “I Thrist! 목마르다.” 그 음성은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다.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던진 그 한마디 “목마르다”. 그리고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길 바라십니까?” 훗날 성녀는 자신의 영적 지도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저는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만질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런 마더 데레사의 말씀과 행적을 보고 그저 새로운 신비주의적 발상쯤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한 수녀의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증거의 메시지였다. 나는 필리핀에서 몸소 이것을 체험했다. 유학 초기 나는 필리핀의 속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서 한국 수녀님들이 계신 선교현장을 구석구석 찾아다녔다. 그 와중에 정말 최악의 빈민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고, 나는 과연 이들에게 삶의 희망이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빈민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도 가졌다.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어린아이들은 여는 다른 어린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늘 몸에서는 시궁창 냄새가 났고, 낮 동안에는 동전 몇 푼이라도 구걸하기 위해서 거리로 내몰렸다. 나 역시 초췌한 모습으로 신학교 기숙사에 돌아오면 나의 온몸에서도 시궁창 냄새가 났다. 그리고 팔 여기저기에 모기에 물려 진물이 났던 자리는 균이 들어가서 노랗게 고름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신비롭게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무언가가 나를 휘감았다. 그것은 바로 깊은 내적 평화였으며,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감이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호화스러움과는 정반대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더럽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평화를 마주할 수 있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신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종국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최후의 심판대에서 당신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예수님은 바로 거리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계신다고 하셨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시험지인 최후의 심판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나의 최종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신앙으로부터 기원하는 그리스도교는 역설적이게도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전복된 신학’을 가지고 있다. 기원전 고대 근동에는 엄청난 강대국들이 존재했고, 그들은 그들 나름의 강력한 신을 모시고 있었다. 그 강대국 가운데 이집트의 파라오는 가장 강력한 신들 중에 신이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서 파라오를 물리쳐 주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나서는 신이 있다면 이는 당시 신학으로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그저 강대국들의 비웃음만을 살 뿐이었다. 그러나 고통 받는 약자들의 편에 섰던 그 노예들의 신이 바로 우리의 하느님이 되셨다. 지독히 역설적이신 그분은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역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마다 ‘신앙의 신비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도 함께 주셨다. 지독히 역설적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해법으로 알려주신 그 구원의 열쇠는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안에 미래 구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 안에 바로 하느님 나라가 활짝 열려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우리는 세상이 주는 행복에 눈이 멀어 끝없이 경쟁해서 올라가려고만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신 하느님은 한없이 추락하고 내려가시려고만 한다.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찾고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우린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한다.

얼마 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만료된 학생비자를 다시 받으러 관공서에 갔을 때 목이 말라 잠깐 편의점에 들러서 생수 한 병을 사 들고 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편의점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빈민가 아이가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방금 산 물을 따서 주었다. 그냥 주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입에 물을 한 모금을 일단 부어 주었다. 갈증과 배고픔에 허덕인 그 아이의 입이 열리고 물이 흘러 들어갈 때 그 어떤 감미로운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역시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예수님은 아시겠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회지 통권41호